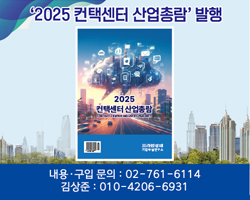[아하!] 은행들은 왜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지킬까?
재무 건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대출 금리·배당 정책에도 영향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02.10 13:21:44

CET1 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가장 안전한 자본(보통주자본)이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감당해야 할 위험 대비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은행들이 갑자기 배당을 줄이거나, 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한다면? 혹시 은행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의 배경에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숨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번 회차에서는 은행들이 CET1 비율을 왜 지키려 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CET1 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가장 안전한 자본(보통주자본)이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감당해야 할 위험 대비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CET1 비율 = (보통주자본(CET1) / 위험가중자산) × 100 |
쉽게 말해, CET1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 비율이 낮으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커지죠.
금융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CET1 비율을 최소 4.5%로 정했습니다. 국내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을 고려해 국내 은행들에 대해 최소 12% 이상의 CET1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4대 금융지주(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CET1 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은 13.51%, 신한금융은 13.03%, 하나금융은 13.13%,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2%를 회복하며 12.08%를 기록했습니다.
CET1 비율은 은행의 수익성, 자산 건전성, 대출 확대 여부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대출이 늘어나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면서 CET1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금액이 커지면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CET1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CET1 비율이 1~3bp(bp=0.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은 CET1 비율을 유지하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배당을 줄이거나 신주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출을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CET1 비율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CET1 비율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비율이 높으면 은행은 자본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CET1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CET1 비율은 은행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금융 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죠.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나 금융시장을 이해할 때 CET1 비율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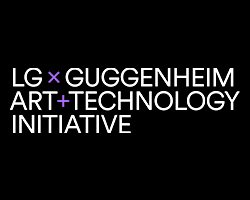


![[포토] 벤처기업협회, 2025년 제30차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209/art_676734_1740719433_245x1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