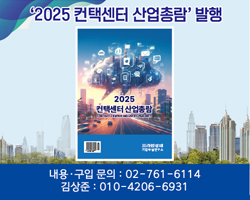[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정작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피하는 구조 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책무구조도'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책무구조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전 사고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이미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선 '윗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일부 사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사례를 남겼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하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꼬리 자르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특히 이번 부당대출 사례에서는 은행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법과 제도의 미비한 점을 방패 삼아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책무구조도 적용 시점'을 내세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는 과거의 금융사고에 대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시점부터 세상에 드러나는 데 평균적으로 약 2년이 소요됐다. 특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금융당국의 입장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란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단순한 선언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 그 실효성을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사례에 대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책무구조도가 이전 금융사고에 적용될 수 없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앞서 마련해야 했다.
이미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앞으로의 사고만 막겠다는 태도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과거의 금융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종종 금융사고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사람이 큰돈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완벽히 방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후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심정을 토로한다.
결국 금융권의 신뢰 회복은 선언적인 조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의 취지처럼, 책임지는 윗선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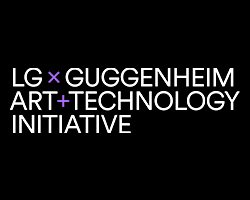


![[포토] 벤처기업협회, 2025년 제30차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 개최](https://www.newsprime.co.kr//data/cache/public/photos/cdn/20250209/art_676734_1740719433_245x140.jpg)